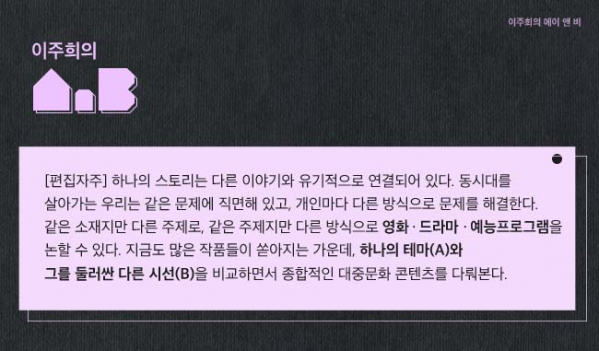

◆ 육식 vs 채식의 싸움일까
최근 첫 방송한 tvN 예능프로그램 ‘식량일기-닭볶음탕 편’은 초보 농부들이 직접 재료를 길러내어 요리를 완성시키는 과정을 담는다. 이들은 작은 농장에서 당근, 마늘, 양파, 감자, 그리고 닭을 키운다. 달걀이 병아리가 되고 그것이 닭이 되면 닭볶음탕을 만들어 먹는다는 것이다.
해당 방송을 본 10개의 동물인권 단체들은 지난 1일 공동성명문을 내고 “닭을 동물이 아닌 ‘식량’으로 규정하는 것은 편파적이다. 원 형태를 알 수 없는 추상적인 ‘살’ ‘고기’로 마주하는 동물이 ‘식재료’라는 일반 인식은 이미 종차별적인 사회에 만연하며, 방송에서 살아있는 닭 여러 마리를 직접 동원해가며 밝혀낼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는 산골에서 슈퍼돼지 옥자를 친 동생처럼 키우는 미자(안서연 분)에게서 낸시(틸다 스윈튼 분) 자매가 고효율 가공식품으로 이용하기 위해 옥자를 미국으로 데려가고, 다시 미자가 낸시 자매로부터 옥자를 빼내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그중 인상 깊은 장면은, 옥자가 도망치면서 족발집을 지나가는 모습이다. 이를 놓고 봉준호 감독은 “홀로코스트의 현장”이라고 설명했다. 봉 감독은 “돼지는 억울한 게 많다. 생명체지만 우리는 ‘돼지’를 생각할 때 동물이라기보다 고기를 떠올린다. 삼겹살이 구워지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즐거운 순간으로 느껴진다. 그런데 돼지가 삼겹살집이나 순대집 앞을 지나갈 때 무슨 생각을 할까.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홀로코스트의 현장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옥자’가 개봉하자 당시 일부 관객들은 “육식을 비판하는 것이냐. 채식주의 영화냐”라고 물었다. 여기까지 보면 ‘옥자’와 ‘식량일기’는 상충되는 의견을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엄연히 따지자면 ‘옥자’는 육식을 반대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미자와 옥자는 강원도 산골에 살면서 고기를 낚고 삼계탕을 먹는다. 봉준호 감독은 이 모습을 평화롭게 그려낸다. 봉 감독은 “육식에 대한 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찍은 것이 아니다. 육식과 채식은 개인의 선택이다. 동물도 육식동물이 있지 않나. 인간은 잡식동물이다. 그게 죄악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다만 봉 감독이 말하고자 한 것은 낸시 자매가 주장하는 대량생산 시스템의 문제였다. 과거에는 고기가 필요한 만큼 직접 길러 잡아먹었기 때문에 자연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이윤을 위해 대량 생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시선에 따르면 ‘식량일기’와 같이 ‘동물을 직접 키워먹는’ 행동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미디어를 통해 이 모습이 직접적으로 보여진다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식량일기’ 측 또한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그들은 방송을 통해 논란을 감추지 않고 터놓고 이야기한다. 출연자들은 딜레마를 느끼고, 학자들은 토론한다.
방송에서 보아, 이수근, 서장훈, 박성광, NCT 태용, 오마이걸 유아, 닉 등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식재료’ 닭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직접 알이 부화하는 과정을 관찰했다. 그들은 부화기의 온도와 습도를 맞추는 것은 물론 알이 깨질까 부서질까 보살피며 탄생의 순간을 함께했다. 검란을 통해 알이 태동하는 것까지 지켜 보았다. 그렇게 21일의 보살핌 이후 병아리가 태어났다. 출연자들은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 그리고 염려까지 다양한 감정을 느꼈다. 이수근은 아내가 임신했을 당시의 초음파를 떠올렸고, 박성광은 “처음엔 마트에서 사온 달걀 같았는데, 이제는 아니다. 감정을 넣으면 안 되는데 이해는 하고 있지만 마음은 무거워진다. 이거 하고 나서 달걀프라이도 못 먹겠더라”라며 거리두기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학자들의 토론도 이어졌다. 진중권 교수는 프로그램 소식을 듣고 “이거 곤란한데. 욕 바가지로 먹겠다. 동물 애호가의 반발이 예상된다”라고 당혹스러워하면서 “이미 도살된 닭이 아니라 생명의 환희를 느꼈던 존재를 잡아먹는다? ‘식품’과 ‘감정을 교류하는 존재’의 두 가지가 상충되는 거다. 처음부터 닭을 잡아먹을 목적으로 키운 것이라면 비난 할 수 없다. 하지만 관계 형성이 된 닭을 잡아먹는 것으로 인해 상처를 받을 것 같다는 사람들의 심리적 부담감도 인정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 했다.
반대편에 앉은 최훈 교수는 “양계장 닭이나 직접 키운 닭이나 같다. 관계보다 더 먼저 생각할 부분은 존재의 의의다. 감정 이입이 식량 본질을 흐리지 않는다. 양계장 닭 또한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 그 닭도 부모 자식이 있다. 이것을 닭마다 구별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다”라고 반박했다.

◆ 의도적인 불편함, 더 많은 토론거리를 부른다
동물인권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 중 “제작진이 프로그램 취지를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떤 노력과 과정으로 식탁에 오르는지 몸소 알아보기 위함’이라 밝혔으나 공장식 축산에서 길러지는 닭으로 만들어지는 닭볶음탕에 있어서 해당 취지는 결코 실현 가능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닭은 빡빡한 밀도로 사육되고 급속한 속도로 성장하게끔 개량돼 생후 한 달 만에 도축된다. 탄생부터 도살까지 이윤 극대화로 점철된 닭의 일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닭 키우기의 수고로움은 전원생활과 자급자족을 내세운 판타지에 불과하다”라고 말한 것은 짚고 넘어갈 만하다.
이들 말처럼 제작진들의 의도와 프로그램 운영 방식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먹는 닭고기와 계란이 어디서 오는 걸까’라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인권단체가 말하는 대로 보여주는 것이 맞을 수 있다. 하지만 동물인권단체들도 간과한 것은 공장식 축산 외에도 여전히 집에서 닭을 길러 먹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만약 동물인권단체가 이야기한 대로 ‘식량일기’가 도축용 닭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 다뤘다면 어땠을까. 이 프로그램은 많이 단순해질 것이다. 진중권 교수의 말처럼 사람들은 도축용 음식은 먹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직접 키운 것은 불가능하다며 눈살을 찌푸린다. 때문에 도축용 닭은 잡아먹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이런 식의 프로그램 구성이라면 동물인권단체가 원하는 방향의 프로그램이 될 수는 있으나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직접 키워서 잡아먹는다’라는 문제는 언젠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논제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일기’의 취지를 ‘어디서 어떻게 오는 걸까’의 문제보다는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둔다면 더 시청자들의 마음에 더욱 와닿을 것으로 보인다.
제작발표회에서 정성원 PD는 “‘먹느냐 마느냐’ 고민은 우리도 출연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라며 이 프로그램의 관전 포인트에 대해 “재미보다는 한 번 쯤 고민했으면 하는 부분을 강조하려고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봉준호 감독의 이야기 역시 우리를 더욱 고민에 빠지게 한다. “‘옥자’에서 들판에서 뛰어노는 동물과 그가 도살장에 가는 스토리,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하면서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유도했다. 실생활에서 우리는 미자이기도 하고 낸시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을 안고 있으면서 마트 카트에는 삼겹살을 넣는다. 우리는 편하게 둘을 구분시킨다. ‘얘는 내 가족이고, 쟤는 내 밥이다’라면서 말이다. 하지만 본질은 같다.”
‘식량일기’를 보고 닭을 먹지 못하게 됐다는 사람도, 혹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닭을 키워 잡아서 먹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 맞았다고 할 수 있을까. ‘식량일기’에서는 1회부터 고민을 시작했다. 이들의 고민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만들어낼지, 시청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자신의 신념을 굳히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비즈 스타] '스프링 피버' 이주빈 “지금 내 인생은 2월 28일”(인터뷰)](https://img.etoday.co.kr/crop/452/294/2298785.jpg)
![[리뷰] '휴민트' 액션 맛은 일품, 스토리 맛은 익숙](https://img.etoday.co.kr/crop/452/294/229434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