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메모리'는 홍성규 대기자가 기억하는 레전드 스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약 30년간 경험했던 스타들의 인간적인 면모들을 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만인의 연인’ 국민배우 고(故) 최진실의 13주기 추모 소식이 얼마 전(10월 2일) 전해졌다. 올해도 많은 동료 연예인들과 팬들이 최진실을 ‘여전히 그리운 국민 스타’로 추억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최진실만큼 대한민국 연예계에 스타로서, 연기자로서 한 획을 그은 연예인도 흔치 않다.
그녀의 영광과 입지전적 석세스 스토리와 밝은 웃음소리에 박수를 보냈지만, 이면에 그를 뒤덮었던 슬픔과 아픔이 따라올 줄은 아무도 몰랐다.
지긋지긋한 가난과의 전쟁 등 고난을 이겨내며 스타의 자리에 올랐지만, 이젠 고생 끝이라며 부와 명예의 기쁨을 맛보기도 잠시, 불의의 세상 속 지옥 같은 마음고생이 다가와 극단적 상황까지 이를 줄 그 누가 알았겠는가.
그래서 그를 아는 팬들과 동료들은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행복을 더 누릴 권리가 있는데 고생만 하고 떠났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있다. 아직도 그를 그리워하며, 놓아주려 하지 않는 이유다.
나는 최진실 데뷔 첫 인터뷰 기사를 쓴 기자였고, 그가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긴 자전적 에세이 ‘그래 오늘 하루도 진실하게 살자’의 대필 작가이다.
내가 다니던 예전 한국일보사 자료실 기사 스크랩 ‘최진실’을 찾아보면, 첫 페이지에 ‘화제의 CF모델 최진실’ 인터뷰 기사가 나온다.
최진실이 나라는 사람과의 인연을 통해, 그의 꿈 많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남기고 간 것이다. 나 홍성규 기자는 그녀의 CF모델 시절 첫 기사부터, 책이 출간된 1998년 청춘스타로서 밝고 행복하던 시절 인생에 대한 기억은 그 어떤 기자보다도 많을 것 같다.
다만 1998년 이후 담당 부서가 바뀌면서, 최진실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지내던 시절과 세상을 떠날 때까지 거의 만나지 못해 술 한 잔, 차 한 잔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격려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일이 못내 아쉽고 안타까움으로 남아있다.
최진실을 마지막 본 것은 내가 신문기자 생활 막바지였던 2000년대 초반이었다. 같은 부서 후배 기자가 “최진실이 신문사 앞 레스토랑에 와 있는데, 같이 가자”라고 해서 따라 나갔다가 소주 한잔 나누고, 헤어진 일이었다.
최진실은 토종 취향이라 술 중에 소주를 가장 좋아했다. 만난 장소는 이탈리아식 카페였는데, 양해를 구하고 일부러 소주를 사다가 함께 마셨다. 그전에 늘 밝고 예쁜 인상을 기억하고 있었던 나는 그날 초췌하고 여윈 얼굴의 최진실을 오랜만에 보게 되었다.
최진실이 “언니 잘 계시지요”하고 물었다. 최진실은 내 아내를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늘 안부를 물으며, 가끔 자신이 쓰는 화장품을 “언니 갖다 드리세요”하고 선물로 주곤 했었다. 쓴 소주가 몇 잔 돌아갔다. 그런데 나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30분도 안 되어 일어나야 했다. 돌이켜보면 좀 더 오래 있을 걸 후회된다. 좀 잘난 체를 하자면 그 당시 나는 대스타 최진실도 뿌리치고 일어날 만큼 저녁 스케줄이 매우 바빴다.
시계를 들여다보며 “미안해 내가 빨리 갈 곳이 있어서. 잘 지내, 건강해야 돼”하자 최진실은 아쉬운 표정으로 “이젠 편하게 자주 뵈어요. 옛날 이야기하며 술도 한잔하고요”하고 답했다. 왠지 마음이 짠~했다. 그리고 그 짧은 대화가 이생에서 최진실과 나눈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몰랐다.

최진실과의 첫 만남, 첫 인터뷰
지금도 최진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녀를 처음 만난 날의 너무도 밝고, 의욕적인 표정과 말투였다.
1989년 나는 연예기자 초년병으로 활동하고 일하고 있었다. 잘 아는 모델에이전시 사장이 어느 날 연락 와서 “삼성전자에서 전속 모델 뽑는데, 우리 소속 모델이 캐스팅됐다. 기삿거리 아니냐”라고 했다.
전통적으로 빅 모델만 캐스팅하는 삼성전자에서 생짜 배기 신인을 쓴다는 것은 분명 뉴스였다.
나는 “한번 데리고 오라”고 했고, 초짜 모델 최진실이 본인 역사상 처음으로 신문사 편집국으로 찾아왔다. 마침 그날 그 모델에이전시 사장이 바쁜 일이 있다며 오지 않아서, 최진실 혼자서 쭈뼛쭈뼛 신문사로 들어왔다.
“저 홍성규 기자님이 누구신지요”, “아 최진실 씨?” 평범하기 그지없는 밤색 여학생 점퍼와 청바지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나타난 최진실을 나는 처음에 새로 들온 아르바이트 학생인 줄 착각했다.
역시 스타는 스타였다는 느낌. 눈빛이 달랐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든가. 그 눈이 너무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웃는 미소도 예뻤다.
인터뷰하고, 사진 촬영한 후 “이제, 다 끝났다. 열심히 잘해요”라고 보내려 했는데 최진실은 “기자님, 밖에 나가서 커피 한잔해요. 제가 살게요”라고 했다.
햇병아리 연예인들은 대개 신문사에 처음 오면 긴장해서 묻는 말에만 답하고, 하라는 대로 하다가 머뭇거리며 돌아가는데, 매니저도 없이 혼자 찾아온 어린 여자아이가 당당하게 “커피 한잔 사겠다”라는 것이었다.
당시엔 나도 연예기자 초년병이었지만 선배들을 찾아온 스타급 연예인들을 수도 없이 봐왔던 입장에서 어린 것이 맹랑하다는 느낌이 아닐 수 없었다.
한 살이라도 어른인 내가 내려 했지만, 커피는 부득부득 최진실이 샀다. 나는 회사 앞 카페에서 최진실에게 커피 한잔 얻어먹으며 일장 연설을 했다.
“연예계가 얼마나 거칠고 힘든 곳인지 잘 모르지. 부모님은 뭐하시냐. 아직 나이도 어리니 대학 가서 공부 더하고, 힘든 일 있으면 어려워하지 말고 연락해라”라고 충고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최진실이 그날 그 자리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거쳐 오게 된 지 일도 모르던 일개 연예기자의 철없는 헛소리뿐이었을 것이다. 나중에 사정을 다 알고 나서 혼자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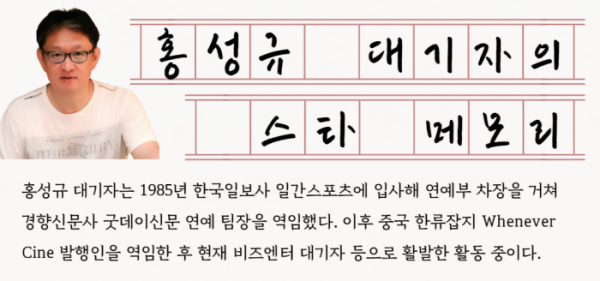
![[종합] '현역가왕3' 홍지윤 결승 1차 1위→이수연·금잔디 탑9 합류…빈예서 탈락](https://img.etoday.co.kr/crop/160/140/2302448.jpg)





![[비즈 포토] '찬란한 너의 계절에' 이성경, 단짠 매력](https://img.etoday.co.kr/crop/450/400/2302084.jpg)
![[비즈 포토] '찬란한 너의 계절에' 오예주, 막내美 발산](https://img.etoday.co.kr/crop/450/400/2302083.jpg)
![[비즈 포토] '찬란한 너의 계절에' 한지현, 하트 발사](https://img.etoday.co.kr/crop/450/400/2302080.jpg)
![[종합] '현역가왕3' 홍지윤 결승 1차 1위→이수연·금잔디 탑9 합류…빈예서 탈락](https://img.etoday.co.kr/crop/190/128/2302448.jpg)
![[주간 윤준필] '왕과 사는 남자' 천만 목전 vs '휴민트' 좌초 직전, 희비 갈린 이유는?](https://img.etoday.co.kr/crop/190/128/2298609.jpg)
![[주간 윤준필] '왕과 사는 남자' 천만 목전 vs '휴민트' 좌초 직전, 희비 갈린 이유는?](https://img.etoday.co.kr/crop/452/294/2298609.jpg)
![[비즈 스타] '스프링 피버' 이주빈 “지금 내 인생은 2월 28일”(인터뷰)](https://img.etoday.co.kr/crop/452/294/2298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