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방송되는 KBS 1TV '이슈 픽 쌤과 함께'에서는 ‘차이나테크의 역습, 중국 과학기술은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강연이 펼쳐진다.
미국에서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전시회인 CES에서 올해 중국은 트렁크에 탑승 가능한 드론이 탑재된 플라잉 카를 선보이는 등의 최첨단 기술이 도입된 제품을 자랑하며 과학기술 굴기를 아낌없이 보여주었다.
그러나 백 교수는 “중국 내에서 열리는 과학기술 박람회에서 중국의 진짜 실력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올해 개최된 중국 최대 AI 행사인 세계인공지능대회(WAIC)에서는 중국 최초의 실물 크기 휴머노이드인 칭룽이나, 고문서 복원 AI 등 놀라운 속도로 발전한 AI 기술이 즐비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AI 스타트업이 놀라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10년 민간의 투자를 받은 중국의 AI 스타트업은 무려 1, 400개 이상이다. 이에 백 교수는 “딥시크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탄탄한 과학기술 생태계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백 교수는 “중국 과학기술의 원동력을 많은 인재와 적은 규제, 높은 수익이 선순환 구조를 이룰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중장기 전략도 한몫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을 제조업 최강국으로 만들자는 ‘중국 제조 2025’ 전략에 따라, ‘신품질 생산력’을 내세우며 기존 제조 강국의 기초 위에 첨단 분야 경쟁력을 더하고 있는 것이 현재 중국 과학기술 발전의 현주소다.

딥시크의 파격적인 행보로 인해 미국 내 AI 기업들이 자극을 받은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딥시크의 출시 이후 지난 2월 구글은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Gemini) 2.0을 공개했고, 일론 머스크도 새 AI 모델을 공개했다. 트럼프 역시 2기 출범 3일 뒤 역대급 대규모 AI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stargate)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무려 우리 돈 700조 원에 달하는 재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미국의 AI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중국을 멀리 따돌리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엿보인다.

마지막으로 백서인 교수는 “과학기술은 단순히 기술 그 자체가 아니다”라며 “기업의 혁신이자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고 사회 안정과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과학기술”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감대와 응원하는 문화 등이 자리 잡는다면 우리나라 역시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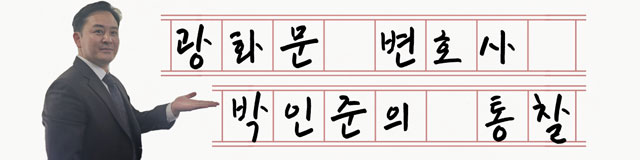
![[비즈 포토] 키키, 해사한 비주얼](https://img.etoday.co.kr/crop/450/400/2151222.jpg)
![[비즈 포토] 키키 수이, 깜찍 볼하트](https://img.etoday.co.kr/crop/450/400/2151226.jpg)
![[비즈 포토] 키키 이솔, 당찬 눈빛](https://img.etoday.co.kr/crop/450/400/2151225.jpg)



![[비즈 스타] '폭싹 속았수다' 채서안, 연출·작가까지 꿈꾸는 '겉절이'의 대담한 도전(인터뷰③)](https://img.etoday.co.kr/crop/452/294/215705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