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쩔수가없다'라고 말하는 이병헌, 정말 어쩔 수가 없었을까?
25년을 다닌 회사에서 노고의 상징으로 장어를 선물 받았던 만수(이병헌). 인생 목표였던 ‘내 집’에서 장어를 굽던 순간만 해도 그는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평온은 곧 산산이 무너졌다.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잘린 것이다.
영화 ‘어쩔 수가 없다’(제공/배급 : CJ ENM)는 이 평범한 남자의 추락을 비극이 아닌 아이러니로 풀어낸다. 살벌한 생존 경쟁 속에서 관객은 피식 웃음을 터뜨리지만, 그 웃음 뒤에는 서늘한 불편이 따라붙는다. 박찬욱 감독은 그 불편을 정교한 미장센과 사운드로 축적하며, 관객의 마음에 흉터를 남긴다.

◆ 평온의 붕괴, 아이러니의 시작
25년 다닌 제지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된 만수는 가족과 집을 지키기 위해 3개월 내 재취업을 다짐한다. 그러나 제지업은 이미 사양산업, 현실은 낙방의 연속이다. 마지막 희망은 ‘문 제지’인데, 여기마저 경쟁자들이 가득하다. 만수는 자기합리화 끝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로 살벌한 결심을 굳힌다. 경쟁자를 하나씩 제거하는 것.
극단적 설정이지만 박찬욱 감독은 이를 블랙코미디로 비틀며 웃음과 불편을 동시에 안긴다. 특히 범모(이성민)의 음악실 시퀀스는 영화가 지향하는 아이러니를 압축한다. 대사가 음악에 파묻히고, 감정은 서로에게 닿지 못하며, 몸싸움과 언어가 뒤엉킨다. 난투극은 웃기지만 폭력적이다. 웃음을 터뜨린 순간 관객은 곧바로 묵직한 질문과 맞닥뜨린다.

◆ 웃음 속에 감춰진 박찬욱의 미학
미장센은 역시 박찬욱답다. 짙은 녹색과 갈색 톤, 분재와 온실, 배롱나무가 심어진 집은 인물의 욕망과 불안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사운드 또한 강렬하다. 1980~1990년대 가요들이 장면마다 삽입돼 대사보다 더 깊은 울림을 남긴다. 긴 슬랩스틱 시퀀스가 편집으로 이어질 때 영화는 웃음과 피로감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한다. 장면 하나하나가 공들여 짜여 있다.
주제 의식은 명확하다. 노동·실직·경쟁이라는 구조적 폭력은 만수를 벼랑 끝으로 내몬다. 평범한 이웃이 범죄자로 변하는 순간, 관객은 “정말 어쩔 수 없었을까”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가족과 집은 사회적 지위를 증명하는 동시에 인물을 옭아매는 족쇄로 작용한다. 특히 만수와 미리(손예진)의 집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인물의 심리와 서사를 동시에 품고 있다.

◆ 배우들의 연기 차력쇼
배우들의 퍼포먼스는 영화의 완성도를 한층 높인다. 배우들은 각자 맡은 분량 안에서 최대한의 리듬을 만들어내며 블랙코미디라는 불안정한 장르의 무게중심을 잡는다.
이병헌은 현실과 코미디 사이를 자유자재로 오간다. 이병헌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이병헌이 아니었다면, 천하의 박찬욱 감독도 어쩔 수가 없었을 것이다.

손예진은 원작 소설 '액스(The Ax)'에는 없던 아내 '미리'를 현실감 있는 캐릭터로 재창조했다. 그는 위기의 가정을 지탱하는 대들보다. 이성민은 비극적이고 안쓰러운 만수의 거울 같은 인물이다.
박희순은 제지업의 기득권을 노련하게 구현하며, 염혜란은 남다른 에너지로 활극의 긴장감과 특유의 유머를 둘 다 놓치지 않는다. 차승원은 짧지만 선한 역으로 등장해 캐스팅 자체의 위트를 드러낸다.

◆ 남는 건 씁쓸한 질문
만수의 동기가 다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배우들의 열연과 아이러니로 무장한 연출이 허점을 메운다. 마지막 자동화 제지 공장의 풍경은 영화관을 위협하는 OTT 대세 흐름처럼, 시대의 파도에 흔들리는 인간과 산업을 상징적으로 비춘다.
만수의 전쟁은 정말 ‘어쩔 수가 없었던’ 걸까. 영화는 그 질문을 끝내 외면하지 못하게 만든다.
오는 24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상영시간 139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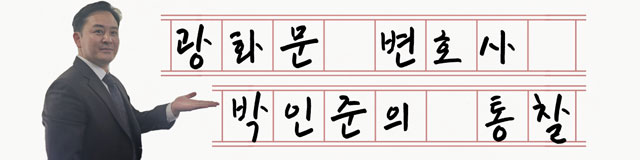



![[종합] '경도를 기다리며' 박서준·원지안, 감동 재회 결말…후속 드라마 2월 방송](https://img.etoday.co.kr/crop/190/128/2280018.jpg)


